아카데믹 소사이어티즈
지구와사람의 포럼은 여러 학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학회는 월례 세미나와 강좌, 컨퍼런스, 출판,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합니다.
각각의 학회는 월례 세미나와 강좌, 컨퍼런스, 출판,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진행합니다.
지구법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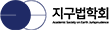 지구법학회는 2015년 지구와사람 창립 당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동해왔습니다.
지구법학회는 2015년 지구와사람 창립 당시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활동해왔습니다.
미국의 문명사학자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는 2001년에 영국 가이아파운데이션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지구법학 컨퍼런스(미국 워싱턴 Airlie Conference)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토마스 베리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구법학 원리를 선언했습니다. 지구법학은 토마스 베리가 제시한 생태대(Ecozoic Era) 문명의 법과 시스템에 관한 철학입니다. “모든 존재는 권리가 있다”,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지구법학은 2016년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이래,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운동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에콰도르 헌법에 명시되었고,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 강의 권리가 입법화 되었으며, 2020년에는 유럽 경제·사회 이사회가 자연의 권리 헌장을 검토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겪는 이 시대는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구법학은 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으로서, 법이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2015년부터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회 인정연수프로그램인 “지구법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회원과 정관을 갖춰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학회 등록을 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독자적인 조직과 콘텐츠를 갖춘 단체로서 국내외에서 그 활동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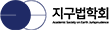
미국의 문명사학자 토마스 베리(Thomas Berry, 1914-2009)는 2001년에 영국 가이아파운데이션과 함께 세계 최초로 지구법학 컨퍼런스(미국 워싱턴 Airlie Conference)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토마스 베리는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구법학 원리를 선언했습니다. 지구법학은 토마스 베리가 제시한 생태대(Ecozoic Era) 문명의 법과 시스템에 관한 철학입니다. “모든 존재는 권리가 있다”,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지구법학은 2016년 유엔 하모니위드네이처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이래, 자연의 권리(Right of Nature)운동으로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에콰도르 헌법에 명시되었고, 2017년에 뉴질랜드에서 강의 권리가 입법화 되었으며, 2020년에는 유럽 경제·사회 이사회가 자연의 권리 헌장을 검토했습니다.
기후위기를 겪는 이 시대는 지구공동체 내에서 인간의 역할을 재발견하고 그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구법학은 법을 포함한 거버넌스에 관한 새로운 철학으로서, 법이 지구공동체 모든 성원의 안녕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2015년부터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대한변호사회 인정연수프로그램인 “지구법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회원과 정관을 갖춰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에 학회 등록을 했습니다. 지구법학회는 독자적인 조직과 콘텐츠를 갖춘 단체로서 국내외에서 그 활동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지구법학의 원리
- 존재가 기원하는 곳에서 권리가 발생한다.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권리를 결정한다.
- 현상 질서 속에서 우주를 넘어서는 존재의 맥락은 없기에 우주는 자기 준거적 존재로, 활동 속에서 규범을 드러낸다. 이러한 우주는 파생하는 모든 존재 양태의 존재와 활동에서 일차적인 준거가 된다.
- 우주는 객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체들의 친교이다. 주체로서 우주의 모든 성원들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행성 지구 위의 자연계는 인간의 권리와 동일한 연원으로부터 권리를 갖는다. 그 권리는 우주로부터 존재에게 주어진 것이다.
-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은 3가지 권리를 가진다. 존재할 권리, 거주할 권리, 지구 공동체의 공진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기능을 수행할 권리?
- 모든 권리는 특정 종에 국한된 제한적인 것이다. 강은 강의 권리를 갖는다. 새는 새의 권리를 갖는다. 곤충은 곤충의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갖는다. 권리의 차이는 양적인 것이 아니라 질적이다. 나무나 물고기에 곤충의 권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 인간의 권리는 다른 존재양식이 자연 상태로 존재할 권리를 파기할 수 없다. 인간의 재산권은 절대적이지 않다. 재산권은 단지 특정한 인간 “소유자”와 특정한 일부 “재산” 간의,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한 특별한 관계일 뿐이다.
- 종은 개체 형태나 양, 우마나 물고기 떼 등과 같은 집단 형태로 존재한다. 따라서 권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방식으로 종이 아니라, 개체나 집단과 관련된다.
- 여기서 제시된 권리들은 지구 공동체의 다양한 성원들이 다른 성원들에 대해 갖는 관계를 수립한다. 행성 지구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상호 밀접하게 연결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지구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은 직·간접적으로 스스로의 생존에 필요한 영양 공급과 조력을 위하여 지구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에게 의존한다. 포식자와 먹이 관계를 포함하는 이 상호 영양 공급(nourishment)은 지구의 각 요소가 포괄적인 존재 공동체 내에서 가지는 역할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은 자연 세계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자연 세계에 접근할 권리도 가진다. 이는 물리적 요구는 물론 인간의 지성이 요구하는 경이로움과 인간의 상상력이 요구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인간의 감정이 요구하는 친밀성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바이오크라시연구회
지구와사람은 2018년부터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한반도와 DMZ 생태 이슈에 주목했습니다. 2020년에는 지구법학회 회원을 중심으로 유엔 사회개발연구소(UNRISD)와 함께 평화· 환경·발전 넥서스를 통해 세계 접경지역의 평화구축을 모색하는 국제 컨퍼런스를 주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구법학의 관점을 도입하여 DMZ를 생명공동체로 접근했습니다. 이 컨퍼런스 기획을 담당한 경희대 미래문명원 안병진 교수를 중심으로 바이오크라시연구회가 발족했습니다.
지구법학은 민주주의(Democracy)를 넘어 자연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보다 포괄적인 제도인 바이오크라시(Biocracy)를 거버넌스 이론으로 수용합니다. 따라서 바이오크라시 연구회는 비인간의 관점을 포용하는 새로운 정치 윤리학과 생태론을 탐구하며, 생태적 관점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또한 현재의 생태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연과 비인간 존재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지구법학은 민주주의(Democracy)를 넘어 자연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보다 포괄적인 제도인 바이오크라시(Biocracy)를 거버넌스 이론으로 수용합니다. 따라서 바이오크라시 연구회는 비인간의 관점을 포용하는 새로운 정치 윤리학과 생태론을 탐구하며, 생태적 관점의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또한 현재의 생태파괴를 극복하기 위해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연과 비인간 존재의 발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생태대연구회
생태대연구회는 2015년 지구와사람의 창립 당시부터 활동해왔습니다. 1992년에 출간된 『우주 이야기(The Universe Story)』에서 토마스 베리는 대멸종의 신생대를 끝내고 지구와 인간이 상호 이익을 주는 새로운 지질시대인 생태대(Ecozoic Era)로 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생태대연구회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의 관점 이동을 통해서 지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간의 과학, 철학, 문화를 연구합니다. 송기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과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명의 철학에 대해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미래의 과학기술사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생태대연구회는 인간중심주의에서 지구중심주의로의 관점 이동을 통해서 지구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인간의 과학, 철학, 문화를 연구합니다. 송기원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과학자, 인문학자, 사회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생명의 철학에 대해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심도 있는 세미나를 진행하며, 미래의 과학기술사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와문화연구회
기후와문화연구회는 2018년에 IPCC 전 위원인 권원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이사장을 중심으로 식물학자, 극지연구가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서 시작됐습니다. 2015년 파리협약에서 약속한 1.5도 상승 억제의 기후대응 뿐 아니라 기후적응도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기후문제에 대해 삶과 문화의 관점에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공감이 그 바탕이 됐습니다.
기후와문화연구회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난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역사적, 지역적으로 검토하면서 기후적응적 대안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의 관점에서 인류문화에 접근하고 새로운 문화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기후와문화연구회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와 난민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역사적, 지역적으로 검토하면서 기후적응적 대안문화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의 관점에서 인류문화에 접근하고 새로운 문화적 삶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